한국에 온 지 25일. 나는 지금 병원에 있다. 부주의한 실수로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번에는 울며 수술실에 들어갔다. 독일에 두고 온 아이와 남편 생각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났다. 퇴원은 언제쯤 하게 될는지. 3주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시 봉합을 한 지 사흘 만에 수술을 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언니 얼굴을 보고 울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전신 마취라 괜찮을 줄 알았다. 문제는 수술 후 통증이었다. 그렇게 아픈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무통을 달고 있어도 아팠다. 첫날의 극심한 통증. 그런데 다음 날부터 걸으란다. 수술 후 사흘 동안의 통증을 내 어찌 잊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통증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신기했다. 며칠 후엔 무통을 뗐다. 매일 세 끼 식후에 먹는 진통제 알약을 처방받았다. 어제는 진통제마저 안 먹었다. 수술 후 사흘 동안은 조금밖에 걷지 못했다. 일어나고 움직이고 눕는 게 다 아픈데 어쩌나. 아픈 게 무서웠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내 친구 M의 충고 덕분이었다. 그 사흘째 저녁에 M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SOS를 했기 때문이다. 한 번에 10분씩 걷는다는 내 말에 M이 걷는 시간을 늘려보라고 했다. 친구도 나도 부종을 걱정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산 압박 스타킹을 신어도 허벅지가 부어오르고 단단해졌다.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떨치고 일어났다. 잦은 검사와 금식으로 변비도 시작되었다. 병원의 규칙적인 삼시 세 끼로 뱃속은 아수라장. 무서운 부종을 해결할 길은 걷는 것뿐이었다. 담당의는 내 수술 부위가 열리지 않게 수술 직후부터 복대 2개를 겹으로 하고 있으라 했다. 그의 온 신경은 복부 안에 다 제거하지 못한 농염에 집중되었다. 부종과 걷는 문제는 내 몫이었다. 그때부터 목표를 달리했다. 하루 10회, 매 시간 20분 걷기로 상향 조정했다. 매일 세 시간, 만 보 걷기. 그렇게 1주일을 걸었다. 수술 후 60kg까지 늘어나던 몸무게는 매일 걷는 것만으로 55kg대로 내려갔다. 변비 해결은 당연. 체중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몸은 가볍다. 걷기로 다리에 힘도 생기고. 아이러니한 건 잃었던 밥맛까지 병원에서 찾았다는 것. 병원밥이 맛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나. 밥과 국, 메인 고기반찬은 손이 덜 가고, 세 가지 야채 반찬을 주로 먹는다. 생선은 먹는다. 요즘은 친정 엄마가 매일 현미밥과 미역국과 나물을 한 가지씩 언니 편으로 보내주신다. 엄마의 음식을 먹자 병원밥에 손이 가지 않았다. 병원이 언니 집에서 멀지 않아 다행이었다. 아직까지 해결 못한 건 잠이다. 입원 후부터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수면제 반 알을 처방받고 5시간 가까이 잤다. 얼마나 개운하던지! 오늘 새벽에는 탕비실에 따뜻한 물을 받으러 갔다가 열린 창문으로 빗소리를 들었다. 어찌나 듣기 좋던지! 내 침대 창 밖 대로에는 벚꽃도 피었다.

- 작가: 뮌헨의 마리
뮌헨에 살며 글을 씁니다. 브런치북 <프롬 뮤니히><디어 뮤니히><뮌헨의 편지> 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마리 오 작가님께서 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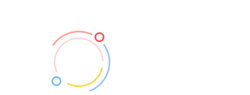



![[독일맘 칼럼]독일 세제 최애템 – Flecken Saltz 2년 사용 후기](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1/05/과탄-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