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선물을 미리 주면 재수가 없다고요?
독일의 선물 문화에 대하여
“A야 생일 축하해! 너 생일에 우리 부모님이 독일에 오셔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선물 주려고.. ”
“어머?! 고마워.. 그런데.. ”
…
“?”
“그런데 독일에서는 생일이 지난 다음에 축하하는 것이 문화야”
나는 그녀를 위한 선물로 한국 수저세트를 준비했었다. 그런데.. 이 무슨.. 정반대의 문화란 말인가. 축하를 하면서도 약간은 머쓱했다. 물론 그녀는 기분 좋게 한국과 다른 독일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한국은 생일을 늦게 챙기면 재수가 없다고 여기지만, 반대로 독일은 생일을 미리 축하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앞서 발설하면 그 기운이 날아가 버린다고 여긴다는 것. 물론 생일 당일에 축하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지만, 진심어린 생일축하는 미뤄서 하는 법이고 선물도 늦게 준다. 생일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일에 대한 축하도 마찬가지다.
독일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선호할까?기본적으로 생일 선물로 거창한 것을 주고받진 않는다. 소소하게 마음을 전하면 그걸로 된 것이다. 제일 보편적인 것은 한국도 비슷한 추세이듯 돈이 편하고 상대도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 단 대놓고 돈 봉투를 건네지는 않는다.
백화점 상품권처럼 바우처, 기프트 카드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드럭스토어, 백화점, 마트 등에서 나온 10유로~30유로 선에서의 기프트 카드는 웬만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선물이다. 이를테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어학원 친구들끼리 1~2유로씩 모아 DM(독일 드럭 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선생님께 선물했다. (10대들 같은 경우 생일 초대장에 본인이 직접 받고 싶은 선물을 요구하거나 예를 들어 10유로라고 돈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그렇다 보니 나도 친구들에게 작지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다. 한국 마스크 팩이라든지, 깻잎 씨앗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건넸고 대부분 오늘이 마치 생일인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독일 사람들은 가족끼리라도 선물을 엄청나게 비싼 것을 주고받진 않는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일은 평범한 독일인에게는 상상조차 닿지 않는 풍속이긴 하다.
선물에 대한 개념은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석사 논문을 쓸 때 교수님에게 바쳐야 했던 각종 선물 및 회비로 인해 진절머리가 났었다. 전공 별로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학과는 좀 유별났다. 회식 메뉴는 매번 교수님이 드시고 싶은 값비싼 음식이었지만 한 번도 본인은 돈을 낸 적이 없으며, 학생들이 여행 등을 다녀온 뒤 갖다 드리는 값비싼 양주는 당연한 옵션이라고 여겼다. 졸업시험을 마친 뒤, 나만 뺀 나머지 학우들이 각자 지도 교수님께 감사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부랴부랴 우리 아버지도 사 드려 본 적 없는 명품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왜 이런 데는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다.
한국사회에서 교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학생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교수의 권한에 따라 나의 졸업 여부가 달려 있으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그렇다 보니 시시때때로 조공을 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독일에서도 교수의 권한은 크다. 그렇지만 복종을 종용하며 절대권력을 휘두르진 않는다. 보통 박사 과정 지도 교수를 ‘Doktorvater’라고 지칭하는데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아버지처럼 막 친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교수님은 어렵다.) 박사 과정 정도 되면 교수와 함께 연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학술적으로 논하고 의견을 나눈다. 학생이 교수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지도 않고, 반대로 원하지도 않는다. 행여나 그런 선물을 했다가는 이상한 학생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남편은 지도 교수님께 딱 세 번 선물을 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서 만들어온 교수님 성함을 새긴 한국식 도장, 한국 전통차, 매해 크리스마스 카드가 전부다. 특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지도 교수님은 차를 매우 좋아하셨다.
(그렇다고 독일의 모든 교수들이 청렴결백한 것은 아니다. 작년 라이프치히에서는 한 전문대학 교수가 일명 뒷돈을 받고 중국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큰 논란을 빚었다; 세계 어딜가나 범죄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다. 독일이라고 다를 것도 없다. 다만 사세지간이 한국처럼 상하복종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과도한 선물을 바치는문화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사제지간뿐만 아니라 집에 초대를 받았거나,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역시 소소한 것들이 많다. 보통 꽃이나 와인(독일에서는 3~5 유로면 괜찮은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 꽃 한 다발 가격도 이와 비슷하다.)을 사가는 편이고, 여행을 다녀와서 그 지역의 쨈이나 페스토 같은 특산물을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독일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선물에 엄청난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다. 이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엄청 쇼핑을 한다. 미국에 비하면 소박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독일도 확실히 크리스마스만큼은 선물을 두루두루 챙기는 분위기다.

독일어로 ‘선물’은 ‘Gift’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Gift’는 ‘독’, ‘격분’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
독이란 의미의 ‘Gift’는 여러 단어들과 만나서 복합명사를 이룬다. ‘Giftmord’(독살), Giftpilz(독버섯), Giftpflanze(독초)..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다.
마음을 전하는 선물은, 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한다. 어떤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선물은 독이 된다. 그래서 선물의 총칭은 상대를 생각하는 시간이 이기도 한 것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이 독으로 작용할 때는, 내키지 않는데 해야 할 때 혹은 과도하게 선물을 챙겨야 하는 피로감에서 온다. 한국에서는 정이 지나쳐서 인지 선물에 대한 부담이 컸다. 생일, 명절, 결혼 등 친인척뿐만 아니라 지인이며 직장상사까지 챙길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고, 부담 역시 그에 상응해서 상승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을 한다고 해도 기본 3만 원 이상은 되어야 했고,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도 축의금은 5만 원 이상이다. 모두가 경조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한결같이 말하지만 신기하게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나마 사회적 관계는 김영란 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그만큼 사이도 가까워졌을까? 그것도 아니다. 허례허식일 뿐일고, 줬으니 받아야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의 심리도 묘하게 작용한다.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선물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게 될까? 아니면 내 스스로 선물에 대한 정립을 세울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만큼은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역시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정서 자체가 소박하다보니 우리 역시 그에 따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직접 담근 김치나 피클, 한국에서 가져온 내수용 혹은 신제품 라면을 건네기도 한다. (해외에서 수출용보다 방부제가 비교적 덜 든 내수용은 좀 더 비싼 라면으로 취급되다보니 내수용은 아주 귀한 것이다.) 하나하나가 귀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들이다.
한 저술가는 선물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 아들에게는 모범, 아버지에게는 효도,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만한 일을 해라.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가 언급한 좋은 선물 중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은 없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마음을 담은 선물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 순진한 생각일까. 남편의 크리스마스 카드 손 편지에 온 가족이 감동해서 돌려보았다는 독일 친구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어 보고 싶게 만든다.
- 작가: 여행생활자KAI
독일 라이프치히에 살고 있는 여행생활자, 주변 살펴보기가 취미인 일상관찰자
- 본 글은 여행생활자KAI 작가님께서 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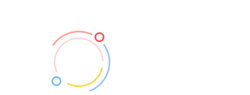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