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얼른 자라. 이제 잘 시간도 훨씬 지났구나. 내일 아침에 안 깨워 줄 거야” 아무리 협박해도 자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모른 체하고 오후에 막 도착한 책, <너에게 행복을 줄게>를 들고 포근한 침대로 들어왔다. 남매 재잘거림을 뒤로하고 책장을 넘기니 책 속 행복이 내게도 쏟아진다. 몇 장 채 읽기도 전에 등에 타고 못살게 구는 녀석들에게 “무겁다. 저리 좀 가라”라고 밀쳐내기를 여러 번, 아랑곳하지 않고 괴롭힌다.
어느새 남편이 오누이를 치우고 안마를 해준다. 그런 아빠를 보고 딸은 입을 삐죽거리며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당연히 엄마가 좋지!” “아빠, 미워. 아빠한테 이제 뽀뽀 안 해 줄 거야” 팽 토라져서 뽀뽀를 무기로 아빠에게 협박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은 계속 묻는다. 결국 “우리 딸도 엄마만큼 좋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엄마 닮아 은근 집요하다. 아빠 사랑도 확인한 딸은 내게 달콤한 말을 쏟아내며 품으로 파고든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유혹에 넘어가 책은 저만치 던져졌다. 그래,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 하면서.
그 찰나 아홉 살 큰 아이는 엄마랑 자고 싶다면서 아빠보다 먼저 내 옆으로 돌진한다. 남편은 엄마 옆은 아빠 자리다. 넘보지 마라. 어서 네 방으로 가거라. 아들에게 엄포를 놓는다.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의 쟁탈전이다. 독립 한지 꽤 되었는데 자꾸 엄마 옆을 탐한다. 아주 간절히! 아빠를 밀어내고 자신이 엄마랑 자겠단다.
아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점점 뼈마디가 굵어져서 사내가 되어가는 아들보다 익숙한 대로 너른 품을 가진 남편이랑 자는 게 편하다. 녀석 잠버릇 중에 머리칼 만지기가 귀찮기도 하고. 젖 떼고 생긴 버릇인데 머리칼을 버스 손잡이 잡듯 잡고 만지작거리기를 좋아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에 반해서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누가 머리 만지는 일이다. 그런데도 아이가 좋아하니 여섯 살까지 도 닦는 심정으로 견뎠다. 어렵게 끊었는데 가끔 머리카락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니 더욱 독립을 바랄밖에.
고민 끝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엄마랑 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이는 주말 대신에 오늘 당장 자겠다고 떼를 쓴다. 이런 날, 힘들고 난감하다. 의지력이 가장 바닥난 때에 떼를 부리면 받아주기가 어렵다. 피곤하고 졸려서 어서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말썽이다. 아이를 결국 자기 방으로 보내고 작은 아이 때문에 남편을 대신 보냈다. 아이 마음을 풀어주고 재워주라고. 그렇게 보내 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 ‘냉정하게 보내지 말고 한 번쯤 그냥 받아줄 걸 그랬나’ 싶어서. 다음날 미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 ‘오늘 밤은 어떡할까. 아이를 밀쳐낸 미안한 마음을 보상해줄까?’ ‘그러다가 독립이 늦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은 없다. 가끔은 아홉 살 된 아들도 엄마 품이 그리울 뿐이다. 녀석은 자기 방에서 혼자 잘 때 외롭단다. 다만 받아주기엔 내 에너지가 부족하고. 결국, 남편이 바닥으로 쫓겨나고 난 남매 틈에 끼었다. 바닥에서 남편은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큰 아이는 “당연히 엄마니까 좋지” 작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목을 껴안으며 좋아 죽는다. 당분간은 엄마 옆자리를 전세 낸 상태라 가진 자의 여유다.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사실은 말이지. 수리수리, 마수리 엄마만 좋아해라 얍! 마술을 걸었어. 비밀인데 너희에게 엄마만 좋아하라고 약을 먹인 거야” 그랬더니만 딸은 “맞아! 찌찌 약!” “오~찌찌 약? 하긴 너희가 젖을 일 년 동안 먹었잖아.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구나. 맞네! 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기특한 생각을 해낸 딸을 꼭 껴안아 입맞춤해준다. 찌찌의 위력으로 그토록 좋아하는 거였구나. 하긴 엄마는 밥하면서도 주문을 건단다. 엄마만 좋아해라. 엄마만 사랑해라. 엄마 수고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매 틈바구니에서 행복이 별처럼 쏟아지는 밤이다.
고민 끝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엄마랑 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이는 주말 대신에 오늘 당장 자겠다고 떼를 쓴다. 이런 날, 힘들고 난감하다. 의지력이 가장 바닥난 때에 떼를 부리면 받아주기가 어렵다. 피곤하고 졸려서 어서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말썽이다. 아이를 결국 자기 방으로 보내고 작은 아이 때문에 남편을 대신 보냈다. 아이 마음을 풀어주고 재워주라고. 그렇게 보내 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 ‘냉정하게 보내지 말고 한 번쯤 그냥 받아줄 걸 그랬나’ 싶어서. 다음날 미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 ‘오늘 밤은 어떡할까. 아이를 밀쳐낸 미안한 마음을 보상해줄까?’ ‘그러다가 독립이 늦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은 없다. 가끔은 아홉 살 된 아들도 엄마 품이 그리울 뿐이다. 녀석은 자기 방에서 혼자 잘 때 외롭단다. 다만 받아주기엔 내 에너지가 부족하고. 결국, 남편이 바닥으로 쫓겨나고 난 남매 틈에 끼었다. 바닥에서 남편은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큰 아이는 “당연히 엄마니까 좋지” 작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목을 껴안으며 좋아 죽는다. 당분간은 엄마 옆자리를 전세 낸 상태라 가진 자의 여유다.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사실은 말이지. 수리수리, 마수리 엄마만 좋아해라 얍! 마술을 걸었어. 비밀인데 너희에게 엄마만 좋아하라고 약을 먹인 거야” 그랬더니만 딸은 “맞아! 찌찌 약!” “오~찌찌 약? 하긴 너희가 젖을 일 년 동안 먹었잖아.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구나. 맞네! 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기특한 생각을 해낸 딸을 꼭 껴안아 입맞춤해준다. 찌찌의 위력으로 그토록 좋아하는 거였구나. 하긴 엄마는 밥하면서도 주문을 건단다. 엄마만 좋아해라. 엄마만 사랑해라. 엄마 수고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매 틈바구니에서 행복이 별처럼 쏟아지는 밤이다.
- 작가: 김유진 / 에세이스트, <엄마라서 참 다행이야>저자
한국에선 가족치료 공부 후 부모 교육을 했으며 현재 마더코칭연구소를 운영하며 2016년 여름부터 독일에 삽니다.
- 본 글은 김유진 작가님께서 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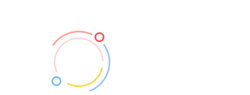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