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어느 날
3년 전, 베를린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 나의 다짐은 이랬다. ‘어차피 3년만 살다 갈 거니까 최대한 짐을 늘리지 말자. 언제 떠나도 될 만큼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로 지내자.’ 한국에서 해외 이사를 위한 짐을 싸면서 일주일 내내 ‘버리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던 그 당시, 한동안은 다짐대로 지냈던 것도 같다. 어느 집이나 정리하다 멘붕이 오기 일쑤인 각종 ‘서랍장’도 서랍마다 항목별로 나누어 잡동사니 뒤섞인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며 지냈다.
얼마나 그랬을까. 어느 순간 이곳의 삶이 익숙해지고 한국에서 짐 정리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는 물건이 쌓여갔다. 살다 보니 꼭 필요해 구매한 물건들도 있지만, ‘여기서 사는 게 남는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해가며 구매한 필수품 외 항목들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
최근 슬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가져갈 짐들을 체크하다 보니, 컨테이너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버리거나 처분해야 할 것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한국에서 가져는 왔으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지하 창고에 그대로 있는 물건도 있고, 여기 생활 방식에 맞추느라 기존의 것이 있음에도 새로 교체한 것들도 있어서 상태는 멀쩡하나 가져갈 필요가 없는, 혹은 가져갈 수 없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았다. 일단 철 지난 의류부터 시작해 하나 둘 정리에 들어간 나에게 독일인 친구가 말했다. “나한테 줄 거나 팔 게 있으면 알려줘. 보고 필요한 거면 내가 살게. 코로나 때문만 아니면 플리마켓에 가지고 나가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장이 다시 열리면 생각해봐.”
그렇다. 여기가 플리마켓, 벼룩시장의 나라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실용적 사고가 강한 독일인들은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짜로 주거나 플리마켓에 직접 매대를 차리고 판매한다. 바꿔 말하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 반드시 새 제품만 고집하지 않는단 의미다. 아주 사소한 생활 용품부터 의류, 책, 장식품, 심지어 대형 가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고거래가 플리마켓에서 이뤄진다.

공식적으로 베를린에만 몇 개의 플리마켓이 열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에게 가장 익숙한 마우어 파크 플리마켓을 대표로 하여 마켓이 열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일요일이면 문을 닫는 대형 마트의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플리마켓이 열리고, 꼭 여러 명이 모이는 마켓 형태가 아니라 해도 길거리 곳곳 중고 물품을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차에 혹은 여행가방에 손 때 묻은 물건들을 실어와 정성스레 진열해놓고 종일 손님을 기다린다. 어떤 판매대는 물건 종류가 다양하고 많고 어떤 판매대는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갖다 놓은 경우도 있다. 판매자들의 나이도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하다. 일부 매대는 중고가 아닌 수제로 만든 새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눈에 봐도 세월이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 물건들이다.
베를린 생활 초창기, 구경거리 삼아 여기저기 플리마켓 체험을 다닐 때만 해도 나는 도무지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좀 과하게 말하면 그냥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은 물건들까지 ‘판매용’으로 진열해놓은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의 플리마켓에서 최고 인기품목인 앤티크 식기류나 크리스털 제품, 각종 장식품을 비롯해 일부 품목 등은 빈티지한 느낌 그대로 눈길을 끌었지만, 심하게 낡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냥 ‘쓰레기’라도 표현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법한 중고품들마저 ‘팔겠다고’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였다.
실제 플리마켓에서 많은 것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분명 있었다. 처음에는 소소한 구경거리를 즐기며 독일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가를 느껴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나중엔 판매인 각자의 진열대를 보며 누군가의 삶의 스토리가 떠올라한 편의 인생 다큐를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뿐이랴. 같은 장소의 플리마켓이라 해도 매주 고정으로 참여하는 일부 판매업자자 외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들고남이 있어 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니 지루할 틈도 없다. 장이 끝나가는 시간이 되면 작은 물건들을 덤으로 주거나 물건값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이벤트’도 있어 잔재미도 쏠쏠하다. 나를 당황시켰던 ‘너무 낡은’ 물건들에 대해서도 나는 점점 관대한 마음과 눈을 갖고 바라보게 됐다. 어쩌면 그들은 물건을 진열하고 보여주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벌써 두 달 가까이 플리마켓이 중단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을 오다가다 수시로 방문했다. 아이는 처음에 플리마켓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맘에 드는 장난감이나 독일어 책을 한 두 번 ‘득템’한 뒤 간간이 “책 사러 플리마켓에 갈까?”라고 말할 정도로 흥미로워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 있는 독일어 책의 대부분이 플리마켓에서 구매한 것들일 정도. 생각 없이 버리던 것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된 것도 플리마켓을 다니며 얻게 된 생각의 변화 중 하나다. 환경 차원에서라도 아직 쓸모가 있는 물건의 공유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오늘의 깨달음>
중고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곳에 살다 보니 무료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됐다. 나눔 한 물건들 모두 어디선가 새 주인 만나 제 몫 다하며 살고 있기를.
- 작가: 어나더씽킹 in Berlin/공중파 방송작가,종합매거진 피처 에디터, 경제매거진 기자, PR에이전시 콘텐츠 디렉터, 칼럼니스트, 자유기고가, 유럽통신원 활동 중, ‘운동화에 담긴 뉴발란스 이야기’ 저자
현재 베를린에 거주. 독일의 교육 방식을 접목해 초등생 남아를 키우며 아이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합니다.
- 본 글은 어나더씽킹 in Berlin 작가님께서 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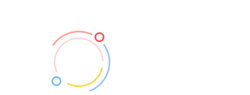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