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는 내 감정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모국어에도 역시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낯선 외국에서 살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말이란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척척 잽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혼 없는 작가/다와다 요코
1979년 19세의 나이로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홀로 독일에 온 일본 작가 다와다 요코.
그녀는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와 일본어. 이중 언어로 글을 쓰고 있다. 새로운 세계와 언어에 대한 체험은 낯선 글쓰기로 이어져 그녀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글들을 탄생시켰다.
나는 무엇보다 다른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유려하게 써 내려갈 수 있음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모국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살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감정들을 글들을 통해서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특히 위의 문장은.. 외국어의 장벽에 부딪치며 좌절을 거듭하는 내게 또 다른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을 이주 혹은 이민이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집,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
무엇보다 새로운 언어를 만나야 한다. 언어는 하나의 세계다.
그 세계로 가는 관문은 실로 만만치가 않다.
그나마 고등학교때 제 2외국어로 독일어를 접한 남편과 달리 내게 독일어는 생경한 언어였고, 막강한 문법의 어려움은 베를린 장벽보다 높게 느껴졌다.
독일어 대체 넌 누구냐??!이 특이한 언어는 명사가 단어만 있으면 되지 그 앞에 남성, 여성도 못해 중성, 복수까지 관사가 붙으며.. 심지어 형용사까지 명사에 따라 형태가 변하며.. 어떤 동사는 반으로 나뉘어 앞뒤로 움직이기 까지 한다.
예컨데 “나는 집으로 가야한다”를 굳이 독일어식으로 쓰면 “나는 ~한다 집으로 가야” 뭐 이런식인거다. 독일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어 자체가 태초에 귀족들만을 위한 언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그들도 인정한다. 독일어가 어렵다는 것을. 새삼 모든 백성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얼마나 훌륭하신분인지..
이토록 어려운 독일어를.. 성인이 되어서 배운다는 것, 즉 언어의 이주민이 됐을 때 부딪히는 크고 작은 절벽들은 내게 깊은 무력감과 넓은 좌절감을 주었다. 다와다 요코의 말처럼 대부분의 단어들이 내 감정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나는 배운 만큼 어쩌면 더 노력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까막눈이 뜨이는 경이로운 경험을 겪기도 했다.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들의 순서 배열을 배워야 하는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새로이 만나게 된 세계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질감이 아주 다른 낯설지만 흥분되는 어떤 시공간이었다.
그저 알파벳뿐이었던 단어들이 품은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정지되어 있던 언어들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때로 인사를 했으며 생각할 거리를 불쑥 던져주기도 했고 단어가 가진 아름다움에 나도 모르게 홀리기도 했다.
무심코 지나갔던 거리의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메타포처럼 말을 걸었다. 글자들을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주는 쾌감은 모국어를 익힐 때와는 또 다른 성취감을 가져다주었으며.. 30년 넘게 발화해보지 않았던 언어가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때때로 야릇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모국어를 처음 익혔을 때도 기뻤을까?모국어로 엄마, 아빠 소리를 내게 되었을 때..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도 나는 이토록 기뻐했을까?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 오면 칭찬해주셨던 부모님의 얼굴만 떠오른다.
모국어는 배운다기 보다 익힌다는 것이 좀 더 맞는..아주 자연스러운 순리 같은 것이라면 외국어는 태생 자체가 달랐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알아간다는 것은 꽤 힘이 부치는 일이었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중언어로 글을 쓰는 그녀의 글에 대해 신형철은 이렇게 말했다.
외국어를 배우면 모국어를 상대화할 수 있다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성인이 되어서 낯선 외국어를 배워본 '언어의 이주민'만이 '언어 자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를 통해 모국어가 내 온몸에 기입해놓은 온갖 생각의 코드를 비로소 의식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나를 먼저 타자화하지 않으면 타자와의 소통이 힘들다는 것. 당신이 '유창한 모국어'에 느낀 구역질이란 '자기가 편협함인지를 모르는 편협함'에 대한 구역질이겠지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신형철단어 그대로 ‘외국어’ 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언어가 아닌 내 밖에 있는 언어다. 체화되지 않았기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이 상황에 이 단어가 맞는지 이 문장의 순서가 맞는지..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내뱉는 말은 그 결이 달랐다.
나를 타자화하지 않으면
타자와의 소통도 힘들다.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모국어를 착착 내뱉는 독일 사람들이 괜스레 미워 보일 때도 있었다.
물론 그들도 나의 언어가 어려울 것이다.
누구에게나 외국어는 어렵다.
나를 상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코드를 마치 바코드처럼 읽히게 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것이었다.
외국에 산다고 하면 외국인 친구가 여러 명 되고 그들과 아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언어라는 충족조건이 아주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나 가능한.. 내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독일어를 자꾸 써야 늘텐데 독일인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이었다. 나는 실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미천한 바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들을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을 말을 정리했다. 써보기도 하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기도 했다.
사람을 만날 때 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만나도 버벅거리기 일쑤였다. 대화는 타이밍이 중요해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설명이 어려울 때.. “내가 독일어를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혹은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더 잘 알았더라면 소통이 쉬웠을 텐데..”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길엔 홀로 번민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 킥을 해대던 숱한 밤이 이어졌다.
당신의 언어의 나이는 몇살인가요?
내 언어 나이 다섯살.. 글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어로는 어느 정도 고급 언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여기서는 다섯 살 꼬마 아이만도 못했다. 육체는 30대 중반이지만 이곳이서 내 언어의 나이는 “좋아해, 싫어해, ~원해, ~살래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동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고작 작 다섯 살이었던 것이다. 형용사라고는 기껏해야 깨끗한, 편안한, 멋있는, 예쁜, 좋은, 밖에 붙이지 못하는.. 아이였다.
따지고 보면 겨우 다섯 살짜리가 집을 구하고, 통장을 만들고, 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를 받고, 병원에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좀 살아보니 언어가 해결되었을까?!
단언컨대 외국에 산 횟수와 언어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언어의 이주민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지난하다. 신은 내게 언어란 달란트를 준 것 같지 않다는 자책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했고 지금도 한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제 그만 독일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아예 사라지진 않았다.
Life is too short to learn German마크 트웨인은 독일어를 배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며 지금도 나를 유혹한다. (작가의 뜻은 아마 그만큼 독일어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독일어는 정말 테러블하다며 나중에 쓸데도 없다며 욕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왕 시작한 이 요상한 끈을 놓고 싶지는 않다.
새로운 언어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를 타자화했을 때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나의 생각 주머니들은 나의 숨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다만 독일어가 너무 미울 땐,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언어의 이주민들이라면 누구가 겪는 통과의례라고 누차 생각했다. 그러면 조금은 힘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언어의 이주민들이시여..
힘내십시오!
- 작가: 여행생활자KAI
독일 라이프치히에 살고 있는 여행생활자, 주변 살펴보기가 취미인 일상관찰자
- 본 글은 여행생활자KAI 작가님께서 에 올리신 글을 동의하에 옮겨온 것입니다.
- 응원의 메세지나 문의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메세지가 직접 전달이 됩니다.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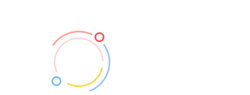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3/10/최연지-일하는-사진-120x86.jpg)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10/KakaoTalk_20221007_100913868_03-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gyrocarpus.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